맥그래스의 "우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는 2015년에 출판된 책입니다. 원제는 "Inventing the Universe"이고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이 나온 것이 2017년이니까 거의 나오자마자 번역 작업이 시작되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맥그래스가 워낙 유명하니까 책이 잘 팔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발 빠르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맥그래스는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우주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책이었고요. 내용은 "우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더 많고, 읽기 더 편한 책은 "우주의 의미를 찾아서"입니다. "우주의 의미를 찾아서"를 토대로 확장한 책이 "우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 표지에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과학과 신앙은 공존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맥그래스의 답변은 당연히 "예"입니다. 과학과 신앙은 공존할 수 있다, 정도의 답변이 아니라 과학과 신앙은 공존해야 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주장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아마도 "우주의 의미를 찾아서"를 읽은 독자라면 많은 내용이 겹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핵심 주장도 똑같습니다. 중심 주장은 과학은 사실에 대한 연구이고 신앙은 의미에 대한 서술이라는 것입니다. 풍요로운 세상살이를 위해서 사실만을 탐색할 수도 없고 또한 사실에 대한 지식 없이 의미를 파악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맥그래스는 과학과 종교가 모두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깊이 있는 연구보다는 폭넓은 연구를 망라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저술된 것 같습니다. 수많은 학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고 단순히 과학과 종교 간 연구를 주도하는 학자뿐만이 아니라 과학자와 신학자, 소설가, 심리학자, 철학자 등 다양한 학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독자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종교의 관계를 탐색하고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저도 이 방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학과 종교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어느 한 분야를 파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 그 안에 매몰되기가 쉽습니다. 과학과 종교 모두 연구 범위도 넓고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20세기에 발전한 양자역학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처럼 20세기 실존주의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신학도 생각의 깊이를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학과 종교 사이의 연구는 각 분야를 깊게 하는 것보다 그 경계선에서 폭넓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좋은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은 총 아홉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읽을 필요 없이 한 장을 뽑아서 읽어도 이해하는 데 별다른 무리가 없습니다. 꼭 읽어볼 만한 장을 꼽는다면 저는 1장, 7장, 9장을 고르겠습니다.
1장. 경이에서 이해로: 여행의 시작
7장. 의미 추구와 과학의 한계
9장. 과학과 신앙: 세상 이해하기-삶을 이해하기

1장은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7장은 이 책의 대표적인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과학은 사실을 추구하는 학문이고 그래서 의미 추구의 영역까지 담당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9장은 결론이니까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과학과 종교의 관계에서 신학자들이 과학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학은 필수적입니다. 과학은 세상에 대한 사실적인 서술이기 때문에 과학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세상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과학을 알면 알수록 세상에 대한 이해도는 더 높아지겠죠? 과학자들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세상을 들여다보고 그 세상을 알려주기도 하고요. 인간의 힘으로 갈 수 없는 곳에 가서 그곳의 풍경을 보여 주고 그곳의 대기 성분도 알려 주고 생물이 살 수 있는지 여부도 판단해 줍니다. 과학자들이 알려 주는 세상의 모습이 많습니다. 신학자들은 과학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과학자들은 신학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맥그래스는 이 책에서 그렇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 과학이 홀로--아니, 무엇이건 혼자서--제공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고 심오한 서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류의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대변자들이 나누는 대화이지, 이미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학문을 옹호하는 데만 집중하여 누구의 말도 경청하지 않는 사람들의 독백이 아니다." (p.284)
맥그래스에 따르면 종교나 신학이 제공하는 것은 더 풍성한 서사인 것이죠.

"9장, 과학과 신앙: 세상 이해하기-삶을 이해하기"에서 맥그래스는 일부 독자가 제시할 만한 세 가지 문제를 다룹니다.
첫째, 발명된 우주? 없는 것 지어내기인가, 있는 것 또렷이 보기인가?
이에 대한 맥그래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이제 분명히 말해 두지만, 나는 내가 옳다고 추천하는 접근법이 참임을 증명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접근법을 받아들여 이 관점에서 세상이 어떻게 보일지 상상해 보라고 독자들을 초청할 수 있다." (p.289-290)
둘째, 합리적 종교: 신비는 어디에 있는가?
셋째, 부적절한 종합? 내가 과학과 종교를 합치지 않는 이유
둘째 문제에 대해서 맥그래스는 자신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짚어줌으로써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맥그래스의 주장을 좀 더 섬세하게 구분하기 위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과학과 종교를 합치려고 하는 시도는 몇몇 학자들에 의해서 시도되었지만 맥그래스의 주장은 이와는 다릅니다. 맥그래스는 종합에 반대하죠.
"이렇게 서사들을 한데 엮는 일은 한사코 사라지지 않는 '궁극적 질문들'을 다루는 데 필수적이다. 이 질문들에 제대로 답하려면 다중의 접근 방식들을 한데 모아야 하고 의미의 다층적 층위--이를테면 인생의 목적, 가치, 개인적 효용감, 자존감의 근거--의 존재를 인지해야 한다." (p.2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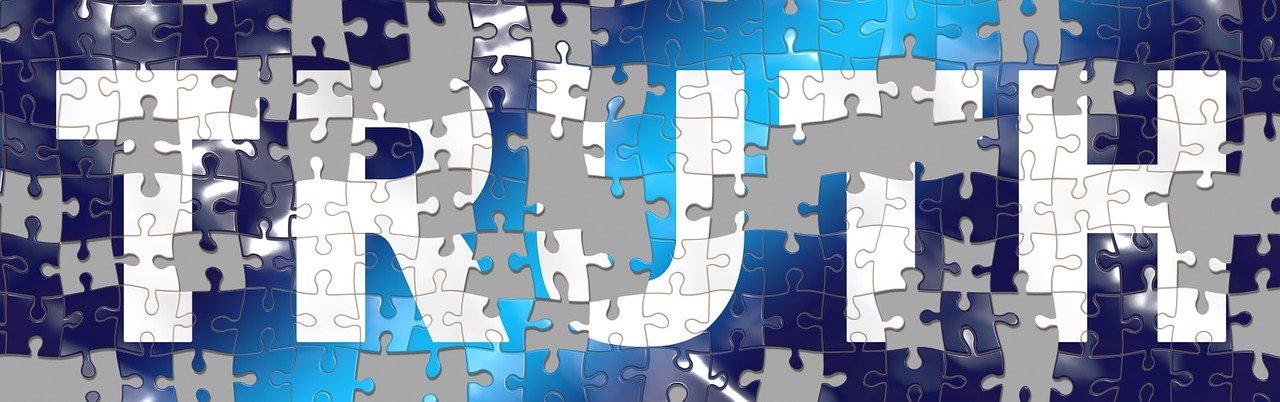
맥그래스는 종교가 어떻게 과학적 서사를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독교는 더 큰 그림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루고 있는 무수한 조각들이 마치 퍼즐의 조각처럼 큰 그림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는 확신을 준다는 말입니다.
둘째, 기독교는 과학이 줄 수 없는 답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인생의 목적, 의미와 같은 궁극적 질문들에 대해서 기독교는 답을 제시하죠.
셋째, 과학에서 발견한 조각난 지식들을 서로 연결해서 과학이 지루한 사실의 열거가 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맥그래스가 아인슈타인과 칼 세이건의 발언을 고찰해 보는 내용도 울림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 나온 이 문장이 이 책의 중심 내용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풍성해진 실재관을 받아들이면 온전한 색상들의 팔레트를 써서 실재를 더 온전히 인지할 수 있는데, 왜 흑백으로 된 실재의 그림에 만족한단 말인가?" (p.313)
더불어서 맥그래스가 프랭크 로즈의 말을 인용한 부분도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1977년부터 1995년까지 코넬 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저명한 지질학자 프랭크 H. T. 로즈는 끓는 주전자의 비유를 써서 이 점을 밝힌다. 누군가 "이 주전자가 왜 끓고 있느냐?"라고 묻는다고 해보자. 로즈는 두 가지 유형의 설명이 주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과학적 층위에서는 에너지가 가해져서 물의 온도를 끓는점까지 높였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설명도 가능하다. "주전자가 끓고 있는 이유는 내가 차를 마시려고 불 위에 그것을 올려놓았기 때문이다." 과연 이 둘 중 어떤 답이 옳을까? (p.70)

맥그래스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도킨스가 워낙 유명하고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열성적이어서 그의 주장에 반대하는 주장을 내세우는 일 자체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저는 웬만하면 학자들의 노력에 비판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편인데 도킨스와 같이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비판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박수를 받기보다는 악의를 가지고 달려드는 사람들을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움츠려 들게 되죠. 아마도 맥그래스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종교와 과학 사이에 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쓰는 그의 용기와 끈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아마도 이 책이 마지막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싸움이 시작되면 멈추기도 힘들고 화해하고 그 앙금이 가라앉으려면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책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칼 세이건이 한 말을 인용한 부분이 있는데 기억하고 싶어서 적어 놓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과 파이를 만들고 싶다면, 먼저 우주부터 발명해야 한다."
'이 책 어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책알림] 과학은 신학의 친구_존 폴킹혼 "과학으로 신학하기" (0) | 2021.03.08 |
|---|---|
| 여행이 모독이 될 수도 있다_박완서 "잃어버린 여행가방" (0) | 2021.03.05 |
| [책] 19세기적 논쟁은 이제 그만_알리스터 맥그래스 "과학과 종교" (0) | 2021.02.26 |
| 부자의 문제_헨리 데이빗 소로우 "시민의 불복종" 중에서 (0) | 2021.02.19 |
| [책] 힘을 포기하고 평화를 회복하라_존 하워드 요더 “예수의 정치학” (0) | 2021.02.18 |